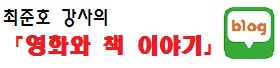\"한국에 고급두뇌가 없어진다\"<현대硏>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인력의 의학, 법학분야선호.. 그리고 최근의 공무원 및 공기업 그리고 교직원 입시의 과열경쟁등..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회의 쏠림현상등에 이어, 고급 두뇌들의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유입은 미흡해 우리나라의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누구나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의 내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000∼2003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3천461명 중 미국 잔류자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3%, 잔류 계획자는 69.6%였다고 밝혔다.
또 1992∼1995년 887명에 불과했던 미국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중 잔류자는 2000∼2003년 2천409명으로 2.7배나 늘었으며 특히 바이오 및 농업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율은 우리나라가 중국(63.4%), 인도(62.3%) 다음으로 높은 61.4%를 기록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지수가 1995년 7.53에서 지난해 4.91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홍콩이나 인도, 아일랜드 등의 두뇌유출지수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두뇌유출지수란 고급 두뇌들의 해외진출 경향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유출이 적다는 뜻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교육 엑서더스가 지속되면서 유학생 수지 적자규모가 1994년 10만명에서 2005년 18만9천명으로 늘어났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수에서 해외 거주 국내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순두뇌 유입율도 1990년 -1.3%에서 2000년 -1.4%로 악화됐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전체 박사학위 과정 학생중 외국인 학생의 비중은 2002년에1.9%로 OECD평균인 13.2%에 크게 못미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은 인적자원 공급을 줄이는 만큼 국가 지식경쟁력과 산업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며 특히, 바이오.나노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두뇌 유출심화와 유입부족은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도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외 고급두뇌 획득 전략이 확립돼 있지 않고 해외고급 두뇌유치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나 해외고급 두뇌에 대한 영주권 발급제도도 없어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고급두뇌 유치를 늘리려면 해외 거주 고급두뇌 활용 네트워크 구축과 이민제도의 탄력적 운용, 국가차원의 해외 고급두뇌 유치노력, 국내 고급 두뇌 활용 지원 방안 보완,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의지일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절대로 이런 문제들이 장기화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